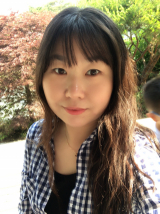
추위가 한풀 꺾이나 싶더니 새순이 고개를 쳐들라치면 이내 들이닥치는 매서운 바람 때문에 겨울인지 봄인지 헷갈리는 계절이었다.
첫 아이의 입학.
꽁꽁 언 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교실에 들어섰을 때의 뭉클함.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렵고 설레고 잊혀 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겠지만 첫 아이의 입학은 부모에게 더욱 특별한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걱정이 앞서는 웅크린 부모 앞에서 보란 듯이 어깨를 활짝 펴고 자리에 앉는 녀석을 보고 있노라니 속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솟아올라 왔다.
그렇게 나는 학부모가 되고 나의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매일 준비물을 열심히 챙겨 지각하지 않게 전쟁 같은 아침 의식을 치르고 등교를 시키고... 학부모라는 감투가 거창한 건 아니었다.
저도 나도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쯤 아이가 종이 하나를 내밀며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애교스런 눈짓을 했다.
“리딩맘? 의진아, 이게 뭐하는 거야?”
“학교 와서 아침에 우리한테 책 읽어 주는 거래! 엄마, 우리가 1학년이라서 책을 아직 잘 못 읽잖아. 그래서 리딩맘 선생님들이 가끔 와서 책도 읽어주시고 이야기도 들려주시는 거래. 엄마는 목소리가 예쁘니까 우리 엄마가 하면 좋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잠자리에서나 읽어 주던 책을 스무 명이 넘는 아이들 앞에서 낭독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부끄러워도 용기 내서 큰소리로 발표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 엄마도 그러면 되는 거야!”
생각보다 논리적인 아이의 말에 감히 반박할 만한 말들이 선뜻 생각나지 않았다.
얼떨결에 신청서에 사인을 했다.
리딩맘은 아직 혼자 독서가 원활히 되지 않는 1~2학년 꼬맹이들 반에 봉사를 신청한 엄마들이 돌아가며 들어가 겹치지 않게 책을 선정하고 나름의 고민을 거쳐 재미있게 책을 읽어 주고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거였다.
사전 모임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리딩맘 엄마들과 담당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냥 집에서 아이들에게 읽어 주시듯이 부담 없이 활동해 주시면 된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딩맘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하나에 어깨가 무거웠다.
첫 번째 리딩맘 활동 날이 잡혔다.
어떤 책을 골라야 아이들이 좋아할까? 호응이 없으면 어쩌지?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어쩌지? 물음표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래! 똥이야, 똥! 아이들은 똥 이야기를 제일 재미있어하니까.’
그리하여 ‘똥 장수 아들’이란 책을 골라 집에서 수십 번을 소리 내어 읽어보고 학교로 향했다. 과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유치원생 티를 미처 다 벗지 못한 아이들이 ‘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깔깔 낄낄 웃음보를 터트렸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내가 생각 한 것보다 이야기에 훨씬 더 집중했다. 임금님 똥은 예쁜 매화틀에, 똥을 밟으면 왜 재수가 좋다고 믿었는지 그리고 똥이 거름으로도 쓰였다는 사실을 귀담아들으며 몇몇 아이들은 손을 들어 질문도 했다.
다음으로‘사랑이 뭐예요?’라는 책을 골랐다.
솔직히 사십 평생을 살아도 어려운 질문이지만 꼬맹이들의 대답이 궁금하기도 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여러 가지고 둥글고, 달콤하고, 거대한 거라고 읽어 주니 한 친구가 말했다.
“아침에 엄마가 아빠보고 여보~잘 다녀오세요! 인사한 것도 사랑이지요? 엄마가 사과를 세 조각 줬는데 동생한테 한 조각 양보해 줬거든요. 그것도 사랑이겠네요?”
맙소사! 아이들은 나보다 이 책을 더 잘 이해했다.
특히 ‘우리 증조할머니’라는 책을 읽어 줄 때에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증조할머니를 태운 꽃상여가 개울을 건너가요. 새 베옷을 차려입은 증조할머니는 훠이훠이 가셨어요.’ 마지막 구절에서는 덩달아 나도 울컥했다.
훠이훠이 가셨다는 표현을 아이들이 이해할까 싶었는데 한 아이가 “우리 할머니도 작년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나비가 되어 훠이훠이 가셨어요” 했다.
어리고 작게만 보이던 아이들이 나보다 더 큰마음을 더 깊은 생각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구나 깨달게 된 순간이었다.
책 한 권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껏 15분 남짓이었지만 아이들 못지않게 내가 배우는 것이 더 많은 시간들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다음에는 또 어떤 책을 들고 갈까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그렇게 길게 만은 느껴지지 않았던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어쩌면 나는 재능 기부, 교육 기부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 순수함을 배우고 편협했던 나의 사고를 투명하게 희석 시키는 소중한 시간들을 선물 받은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고 있었던 올해 3월, 둘째 아이가 형의 후배가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야속한 시절 속에 입학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아이가 짠하기 그지없지만 또다시 따뜻한 봄이 돌아오면 아이의 손을 잡고 리딩맘 선생님이 되어 학교로 향할 수 있지 않을까?
솜털이 뽀송하던 꽃봉오리가 우리들의 눈을 피해 팡팡 터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돌아오면 ‘엄마 어릴 적에’라는 책을 들고 갇혀 지내느라 수고한 아이들에게 마음껏 바깥 놀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